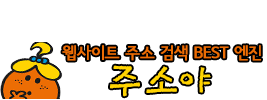그 저녁의 버스 1
그 저녁의 버스 1
살아오면서 가장 야릇하고 짜릿했던 순간을 꼽으라면, 나는 두번 생각하지 않고 그때를 꼽을 수 있다. 살아 생전에 정말 딱 한번만이라도 다시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 저녁의 버스……
행여 화끈한 무엇을 기대하며 이 글을 클릭하신 님들께는, 글의 아주아주 소프트함에 대해 미리 양해 말씀 드리는 바이다.
몇 해 전의 일이다. 강남역 근처의 회사에 다니며 혼자 자취 생활하던 나는 주말을 맞아 지방의 집엘 다녀오는 길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수도 있는 날씨에 대비하고자 입지 않는 잠바를 팔에 걸치고 다니고, 내려가는 버스에서는 켜지 않았던 에어컨을 올라오는 버스에서는 드문드문 켰었던 등의 정황으로 보아 4월 말에서 5월 말의 사이였던 것 같다.
오후 5시쯤 터미널에 도착한 나는, 30~40분 후에 서울을 향해 출발하는 일반 고속 버스표를 어렵게 구해 들고 버스 출발 5분여 전의 시간까지 대합실의 TV를 보다가 버스에 올랐다.
주말을 맞아 가족들 계신 집에 내려왔다 올라가는 직장인, 학생들로 인해 환한 버스 안은 거의 빈자리가 없다시피 했다. 나는 버스표에 찍힌 번호의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때 내 뒤를 좇아 버스에 오른 아가씨가, 두 사람 모두 앉아있던 내 바로 뒷자리에 좌석 번호 확인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내 뒷자리의 창가쪽에 앉았던 아가씨가 일어나 내 옆자리로 옮겨오는 상황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다음 순간에 대한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아가씨가 창가쪽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부탁해 내가 통로쪽으로 옮겨 앉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통로쪽에 앉아있던 내게 지나가겠다는 양해를 구한 후 그 아가씨가 나를 지나 창가쪽 자리에 앉았던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아가씨는 나의 오른편 창가쪽에, 그리고 나는 아가씨의 왼편 통로쪽에 앉은 채 버스가 출발했다. 한낮은 지났다지만 아직 햇볕은 남아있는 그저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서울행 고속버스였다.
옆자리의 아가씨는 위아래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무릎 정도 내려오는 스커트에 목이 약간 패인 긴 팔 셔츠가 원피스인지 투피스인지 그때까지는 알 수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나이는, 나중에 물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7(구칠)학번이라고 했으니, 4년제 대학을 나왔다면 갓 초년의 사회인이거나 전문대를 나왔더래도 고작 2~3년 차 사회인인 아직 20대 초중반의 나이였을텐데, 첫눈에 보기에도 딱 20대 초중반일 것 같은 화장기 없는 갸름하고 뽀얀 얼굴이었다.
그 당시에는 일반 고속버스까지 위성 TV가 널리 장착되지 않았었는지 빈 자리없이 꽉 찬 버스 안은, 톨게이트를 지나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고요를 넘어 적막하기까지 했다.
옆자리의 아가씨도 조용히 앉아있다가 눈을 감고 잠을 청하기도 했다가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나는 창 밖 풍경을 바라보는 척하며 그녀의 행동 모두를 살필 수 있었다. 찬찬히 살펴보는 내 시야 속 그녀의 옆모습은 아주 청순하고 선량할 것 같은 그냥 그것이었다.
그녀가 눈을 감고 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이제 나는 경계심 없이 그녀를 바라볼 수 있었다. 예뻤다. 마침 반대쪽 차창을 통해 매우 붉은 노을빛이 차 안을 그득히 채웠고, 무슨 용기에서 였는지 나는 그녀를 만져보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전생에 대단한 인연이었다고 한다지 않나.
그녀를 살짝이나마 만져볼 수 있다면 ‘옷깃’과는 비교 안 될 큰 인연일테고, 그렇다면 혹여 다음 생에라도 다시 큰 인연으로 만나질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며, 혼잣속으로 소설 쓰고 영화 찍고 했었던 듯싶다.